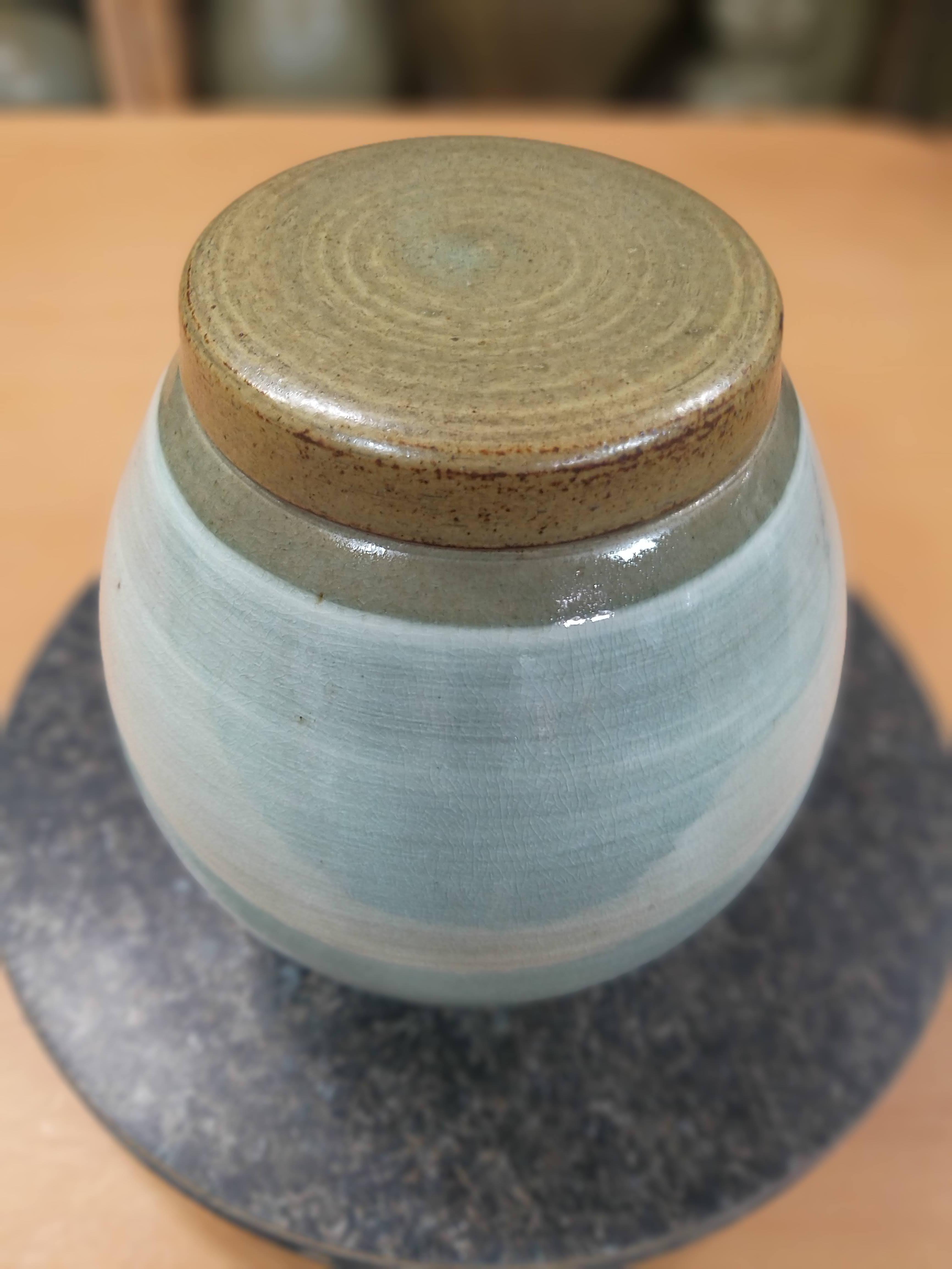예에서 시작하고 예로서 끝을 낸다 (3021회. 7차 연재 논어, 향당 16) 잘 때는 죽은 사람처럼 자지 않았고 집 안에선 엄숙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부모의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비록 잘 아는 사이일지라도 반드시 엄숙하게 얼굴빛을 지었고, 면류관(관리)이나 시각장애인을 보면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추었다. 상복을 입은 자에게는 모르는 사이라도 그렇게 예를 표했다. 잘 차린 상이 나오면 반드시 정색하고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 천둥이나 바람이 심하고 세차도 반드시 얼굴빛이 변하셨다. 공자님의 일상생활 예절을 보여주고 있다. 예에서 시작하고 예로서 끝을 낸다. 천둥이나 바람이 심하다면 천기가 변하는 것이니 이는 천심(天心)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더욱 몸을 바르게 하였다 한다. 침불시..